[조경명사특강]서원우 박사의 나무와 문학[제10회]
시시(詩詩)한 나무이야기 ⑩19. 시월의 강산은 색채의 향연(饗宴)
영국의 속담에 ‘커피는 진해야 맛이고, 사랑은 정열적이라야 하며, 세계의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서 온 산야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면 마치 가을의 금강산을 본 듯 온 산야에서 풍악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데서 그러한 말이 유래되었는지 모른다.
풍악산은 가을 단풍의 대명사로 금강산을 지칭하지만 우리의 자연관은 같은 산이라도 계절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불러 자연의 무한한 변화와 다양성을 선양하고 있다. 그래서 봄철은 금강산(金剛山), 여름철은 봉래산(蓬萊山), 가을철은 풍악산(楓嶽山) 그리고 겨울철은 개골산(皆骨山)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환경과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범주인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 그리고 다양성의 범주를 모두 섭렵한 개념을 우리의 가을 날씨가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푸르기만 하던 나뭇잎이 울긋불긋하게 단장(丹粧)하는데서 도시민들은 황홀한 색채의 향연에 심취하고, 시인묵객들은 한없는 유정무정의 심오한 감회를 느끼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농부들은 바쁘게 추수를 서두르면서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계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 봄의 꽃과 신록의 환희에서 시작하여 한여름의 짓 푸른 성장을 추억으로 간직한 나무가 이별과 소멸의 시간을 준비하는 화려한 색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자연과학의 내면을 성찰해 본다면 단풍은 푸르던 나뭇잎이 기온 차와 일조량의 감소로 인해 엽록소의 광합성작용이 쇠태하면서 그 속에 잠재해 있던 붉은 색소의 안토시안과 노란색소의 카로틴 그리고 샛노란 색소의 크산토필이 드러나는 마치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고, 노랗고, 샛노랗게 변화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잎은 맑은 서리에 취하고, 으슴푸레한 달빛이 억새와 갈대꽃에 숨으면 가을은 어느덧 짧게 가버린다.


설악산 비선대의 장군봉-형제봉-적벽의 장엄한 암봉(巖峯)의 개골미(皆骨美)와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비선대 계곡의 그윽한 정경

대청봉에서 시작된 단풍이 비선대에도 물들기 시작한 계곡의 정취와 방금 선녀가 목욕을 하고 날아오른 듯한 작은 연못의 정경


봄 연못(春塘)가의 나무가 푸르렀던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연못(秋塘)으로 변모하며 연못에 투영된 또 하나의 가을이 물속에서 깊어 감을 느끼게 하는 창경궁 춘당지의 정경




20. 시월상달은 향촌(鄕村)의 향연(饗宴)
가을걷이가 끝나가는 들녘은 농민에게는 수확의 희열(喜悅)을 맛보게 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텅 빈 논과 밭은 배품과 비움의 미학이 들어나는 시월상달의 전원풍경이다. 산야에도 원색의 단풍이 곱게 물들고 나면 곧 자연의 속살을 보이는 비움의 미학이 시작될 것이다.
시월상달은 수확과 나눔 그리고 자연에 감사하는 계절이기에 ‘열매를 딸 때는 그 나무를 생각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라는 고사를 되새겨 보는 계절이다. 더욱이 음력 시월상달에는 농촌의 큰 이벤트로 겨우살이 준비는 물론 그간의 농사일을 무사히 마치고 걷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로 신령께 고사 드리고 온 마을이 기쁨을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농가월령가에서도 ‘술 빚고 떡 하여라 동네 모임 날 가까워 왔다/꿀을 떠서 단자 떡 메밀 아사 국수 하소/소 돼지 잡으니 음식도 푸짐하다/돌 마당에 차일치고 동네모아 자리 깔아/나이차례 틀릴세라 남녀구분 따로 하소/풍악 패를 데려오니 광대도 춤을 춘다/북치고 노래하니 그 노래가 제법이라/마을의 어른들은 잔말 끝에 취하고/마을의 유지들은 오랑캐 춤을 춘다/술잔을 올릴 적에 동장님이 윗자리서/잔 받고 하는 말씀 자세히 들어 보소/어와 오늘놀음 이 놀음이 뉘 덕인가/하늘은덕 그지없고 나라은혜 지극하나/다행이 풍년만나 굶주림을 면 하도다(하략).’라고 읊고 있어 농악과 남사당의 여섯 마당놀이가 우리 농경문화의 아름다운 예능의 뿌리였음을 감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문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꽃은 미풍양속과 ‘향약(鄕約)’을 들 수 있다. 즉 ‘나쁜 행실은 서로규제(過失相規)하고,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도와 주며(患難相恤), 좋은 행실은 서로 권장(德業相勸)하고, 그리고 좋은 풍습과 예절은 서로 사귀어 지키는(禮俗相交) 사대덕목으로 마치 마을의 관습헌법처럼 전래되어 마을의 안녕과 질서는 물론 번영을 구가하는 자치규약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소중한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원색으로 곱게 물드는 시월상달의 푸짐한 마을잔치를 두고 ‘사람은 가장 인간다울 때 놀고, 사람은 놀 때 가장 인간답다.’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말에 앞서 우리의 농경문화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은빛의 소리꾼 억새와 갈대가 지난시절 청산과 강물의 이치와 사연을 노래하는 듯 마지막 들꽃 코스모스가 배웅하며 그윽한 이별의 향연을 펼치는 정경(사진_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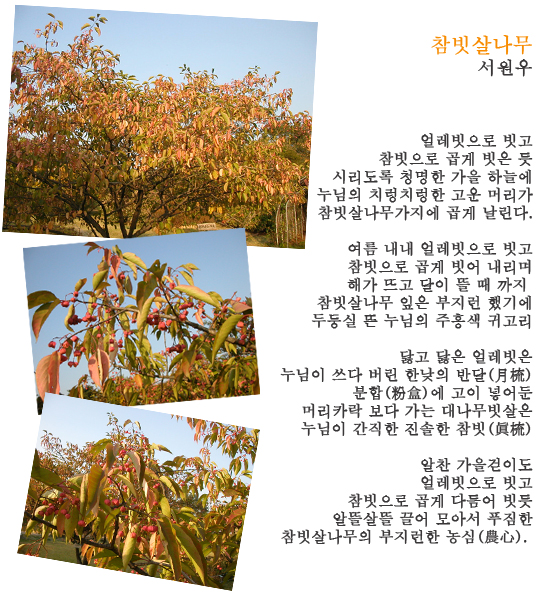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