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명사특강]서원우 박사의 나무와 문학[제7회]
시시(詩詩)한 나무이야기 ⑦
13. 한여름의 침엽수림은 삼림욕(森林浴)과 치유(治癒)의 바다
숲의 공익적인 가치는 연간 무려 7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약 150만원의 휴양가치(산림과학원 발표 2008년도 기준)를 향유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숲의 가치를 창출한 독림가(篤林家)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단체 및 관계기관의 노력에 대한 공익적 보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마치 자연환경에서 공기와 물이 삶의 불가결한 절대요소지만 이를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향유하는 것에 비유 할 수 있겠다.
삼복더위와 긴 장마로 인한 한 여름의 높은 열역학(high entropy)은 우거진 나무그늘과 싱그러운 풀 그리고 맑은 물만이 낮은 열역학(low entropy)의 균형자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침엽수림은 오늘날 휴양림과 삼림욕의 경지를 넘어 이제 삼림치유(forest therapy)가 마치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처럼 시도 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히포크라테스(그리스의 의성, 기원전 4세기경)가 버드나무와 조팝나무의 잎으로부터 해열 진통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을 추출하여 ‘아스피린’으로 인류를 구제한 이래 현대의학과 생명공학은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동양의학 역시 고대 중국 전설상의 의성 편작(扁鵲)과 후한(後漢)의 명의 화타(華陀)가 긍휼(矜恤)과 인술(仁術)에 입각한 의술을 펼쳐 인류를 구제하고 성대한 발전을 거듭하며 인류건강과 수명에 공헌하고 있지만, 그에 역 비례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을 비롯하여 정신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만성질환, 특히 암 질환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의 과학문명은 삶의 육체적인 안락을 넘어 향락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희열감을 상실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과 생명의 원초적 색채인 녹(綠)의 결핍과 괴리에서 오는 것은 아닐지?
백악기에 번성하였던 공룡의 멸망을 녹의 결핍으로 추정하는 학설을 인정한다면 오늘날의 도시문명을 그 공룡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가 아님을 전남 장성군 축령산의 편백나무 인공림에서 그 가정이 성립될 것이다.
전술하였던 ‘사람과 나무(2회 3편)’ 그리고 ‘나무와 숲의 미학(3회 5편)’에서 고대 중국의 오나라 명의 동봉(董奉)이 조성했던 행림촌(杏林村)의 큰 의미를 다시 회상하여 본다면, 애국적인 독림가로 1950년대부터 1987년 타계할 때까지 한 평생 산에 편백나무를 심는 일에만 일생을 바친 한국판 ‘매일 나무를 심는 사람’의 주인공 ‘故 춘원 임종국’ 선생을 현대판 동봉(董奉)에, 선생의 그 선견지명을 가칭 ‘편백나무 향림촌’으로 비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침엽수림에 들어가면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의 오감은 물론 숲의 신비한 점이나 깊은 본질을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마음의 기능인 제육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편백나무 숲에서 발산하는 방향성 물질인 신비의 피톤치드(phytoncide)에 함유된 테르펜류, 페놀류, 탄화수소류에 의한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작용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삼림의 유기적 복합기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과학의 한계 역시 인식의 문제라고 가정 한다면, 그 중 숲의 치유기능은 장차 통합의학이나 대체의학과의 융합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여름의 숲이 삼림욕의 청정해역이고 치유의 병원이라면, 나무는 의사요 꽃은 간호사이며 새들을 비롯한 뭇 야생동식물은 합창단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숲이 통합의학이나 대체의학과의 융합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해와 달과 바람과 물 그리고 별빛이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숲의 교향시적 치유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전남 장성군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길에 신비의 방향성 피톤치드가 마치 안개처럼 피어나는 듯한 ‘산소 숲길’의 정경(사진:치유의 숲 관리소 김인중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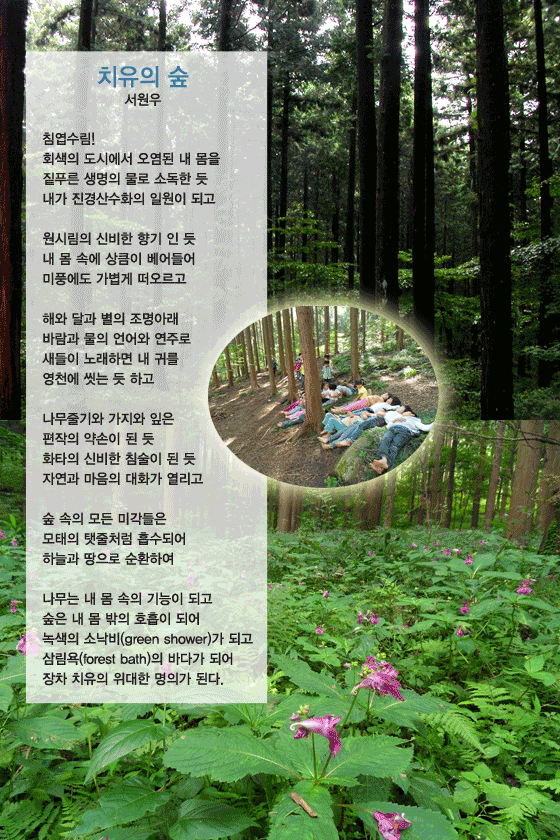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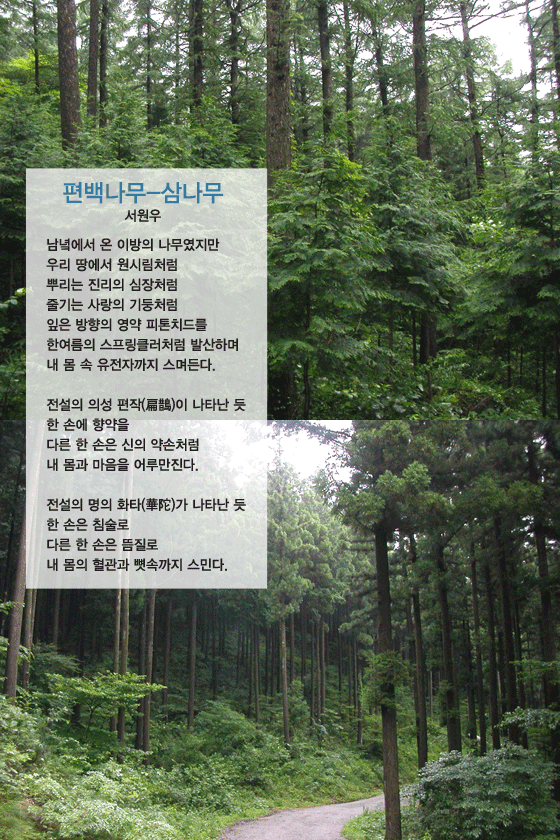
사진설명_전남 장성군 추령산 편백나무수림의 어미나무가 어린나무를 포용하고 있는 정경(상단)과 산소숲 길(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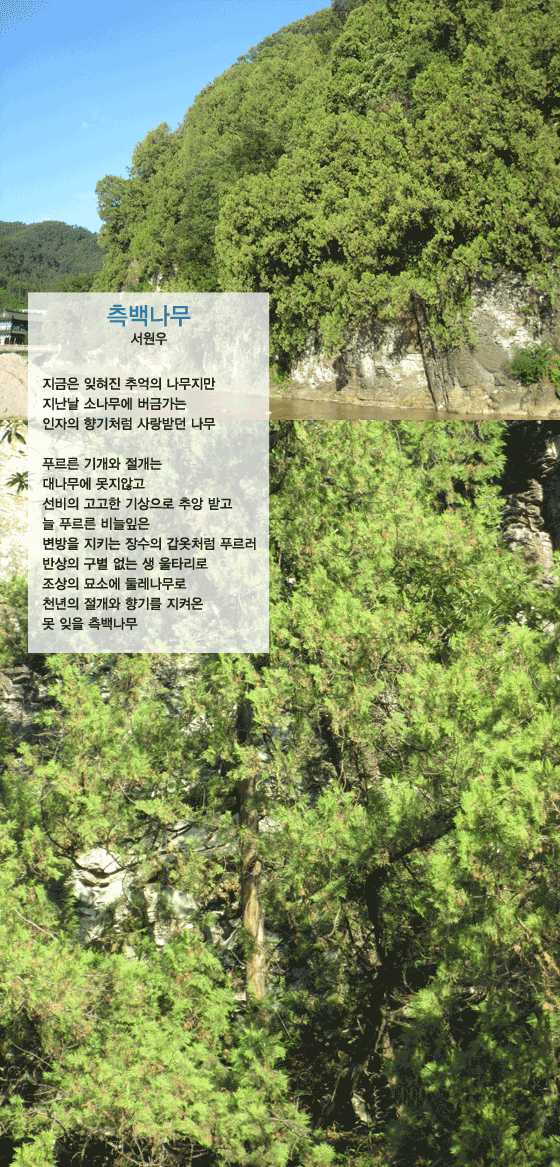
|
‘절벽의 푸른 삼나무는 기다란 창같이 늘어 섰네 / (古壁蒼杉玉槊長) 거센 바람 끊임없어 사계절을 향기롭구나 / (長風不斷四時香 ) 정성스레 다시 더욱 힘들여 가꿔 놓으면 / (慇懃更着栽培力) 맑은 향기를 온 고장에 함께 할 수 있으리 / (留得淸芬共一香)’ -사가 서거정의 북벽향림 시비에서 전재 |
사진설명_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의 천연기념물 제1호인 측백나무 수림은 대구 10경중 제6경으로 조선조 초기 사가 서거정이 읊었던 ‘북벽향림(北壁香林)’의 원경과 근경의 정경(사진: 전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 박용구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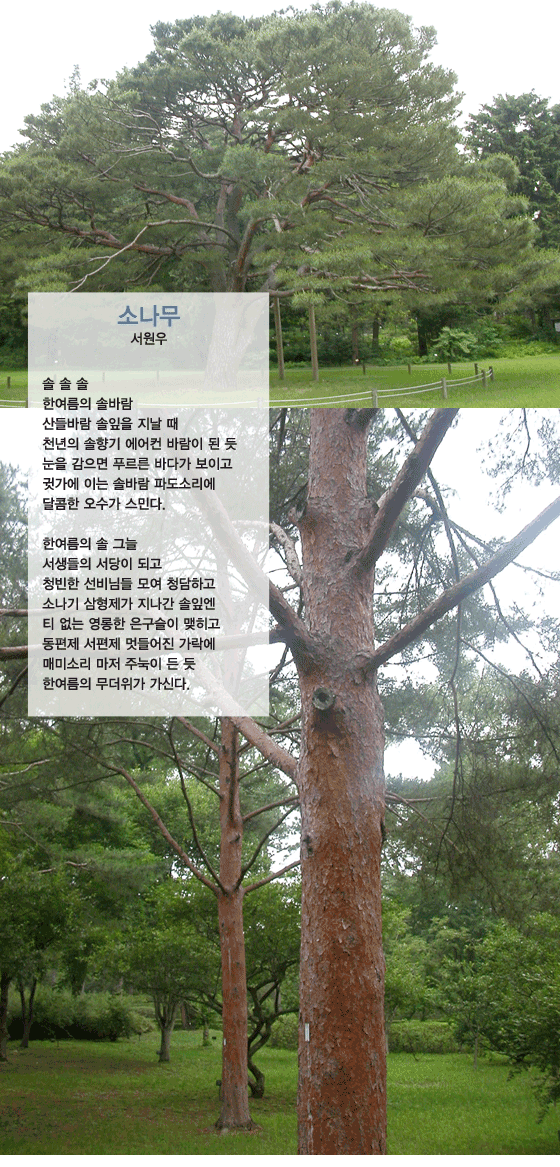
사진설명_국립산림과학원의 아름다운 반송의 정경(위)과 광릉국립수목원의 강송(剛松)의 수려한 자태(아래)

사진설명_강원도 횡성 청태산의 울창한 잣나무수림(위)과 간결한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이 행복한 조화를 이루는 정경(아래)(사진:강원대학교 건축조경학부 박봉우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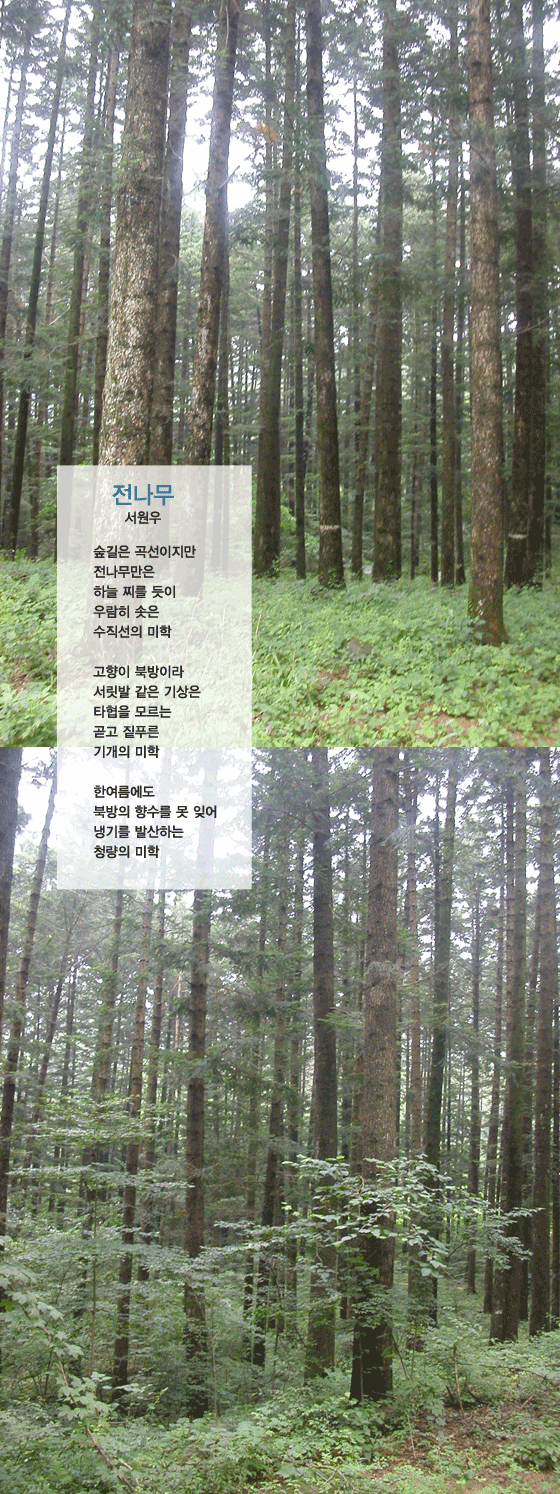
사진설명_광릉국립수목원의 전나무수림이 한여름의 청량한 향과(香浴)과 치유의 적소임을 손짓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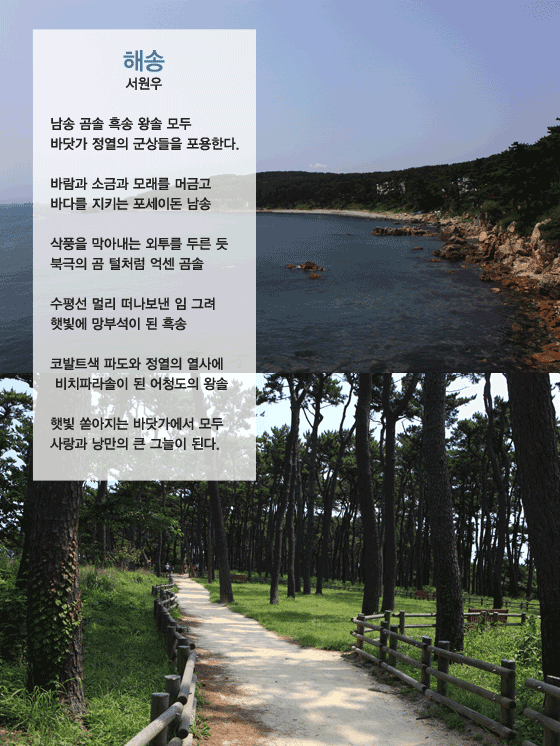
사진설명_울산 방어진 울기등대의 해송 숲길과 일산해수욕장을 위요한 짙푸른 해송숲.(사진:(주)신정조경 허남태 사장 제공)
14. 칠월의 복더위와 옛 선비들의 여름나는 지혜
음력 칠월 칠석은 까마귀와 까치의 갸륵한 희생으로 은하수에 오작교가 놓여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번 만난다는 뜻깊은 전설의 명일이다.
복더위와 지루한 장맛비로 점철된 달이지만 절기로는 이미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와 말복 그리고 특히 삼원(三元: 정월보름, 칠월보름, 시월보름의 명일)에서 중원(中元)인 백중(伯仲)이 드는 달이기도 하다. 또한 이여서 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가 다가와 역시 절기로는 여름과 가을의 갈림길에 있지만 한번 달아 오른 폭염은 가시지 않고 늦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옛 선비들의 더위 식히는 방법이 지극히 숲 친화적이라 할 수 있어 오늘날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산 정약용의 ‘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일(消暑八事: 동아일보 연재 황중환의 386c )’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나무 숲에서 활쏘기(鄕射), 둘째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타기, 셋째는 대자리 위에서 바둑 두기, 넷째는 비오는 날 연못의 연꽃 구경하기, 다섯째는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여섯째는 비오는 날 한시 짓기, 일곱째는 강변에서 투호놀이, 여덟째는 계곡이나 달밤에 발 씻기로 열거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 숲에서 활쏘기는 더위를 심신으로 연마하고 참 선비의 도에 이르는 우리 만의 경지를 향유하고 있어 오늘의 레포츠를 능가하는 신선한 것이다. 또한 비오는 날의 연꽃구경과 한시 짓기는 무더위와 장맛비(오란비)에도 자연의 심오함을 자신의 정서와 수련으로 승화시키는 일로서 요즘 시대에 본받을 만하다. 즉, 비오는 날의 연꽃구경은 비와 연꽃의 심오한 생태성을 군자의 도리로 삼고 있고, 비오는 날의 한시 짓기 역시 심신의 정진을 위한 것이다. 동아일보 연재 ‘한자이야기’에서는 “누워서 읽는 시는 한가해서 좋고, 문 앞의 풍경은 비가 와서 아름답다(枕上詩篇閑處好, 門前風景雨來佳).”라고 읊고 있다(서울대 중문학과 오수형 교수 주석).
한여름의 소리풍경으로 빗소리는 더위를 식히는 소나타이며, 비 그친 다음 개구리 울음소리는 무논의 벼를 대신한 합창이고, 솔숲의 매미소리는 더위를 씻어 내리는 소리의 삼림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우리의 농경사회에서 한여름의 아기 울음소리는 가문의 번성을 알리는 소리요, 남녀노소의 웃음소리는 한 집안의 화평을 알리는 소리이며, 특히 소나무 그늘아래에서 젊은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한 집안과 마을은 물론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소리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사진설명_경주 안압지를 수놓은 한여름 연꽃세상의 미소(사진:(주)신정조경 허남태 사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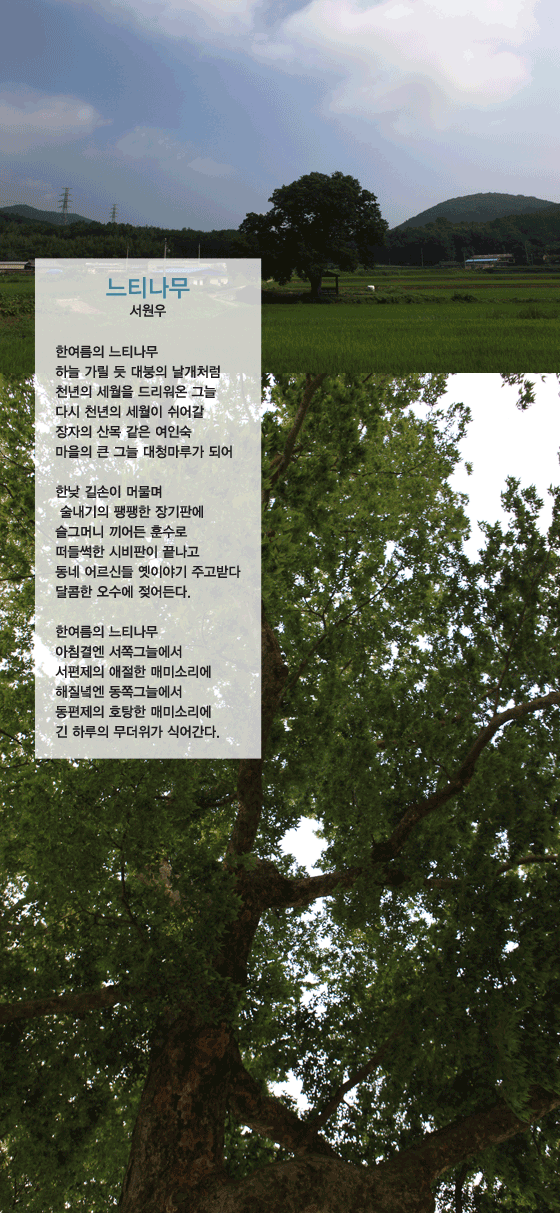
사진설명_경주 내남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천년세월의 그늘을 드리운 듯한 정경.(사진:(주)신정조경 허남태 사장 제공)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kegjw@nva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