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지 파크

- 저자
- 줄리아 처니악, 조지 하그리브스 엮음
- 출판사
- 도서출판 조경|출간일 2010.12
- ISB(S)N
- 978-89-85507-73-8|판형(페이지) (288)
 가격
가격- 18,000원-%16,200원
판매자 : 도서출판 조경 | 문의 : Tel. 031-932-3122 | E-mail : lafent@naver.com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도서출판 조경와(과) 라펜트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배송, 반품, AS 등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조경(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도서출판 조경와(과) 라펜트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배송, 반품, AS 등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조경(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 책 『라지 파크』는 대형 공원의 설계적 문제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와 쟁점에 접근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2003년에 하버드대학교 설계대학원에서 개최된 동명의 컨퍼런스와 전시회의 성과를 다듬어 이론가 줄리아 처니악과 조경가 조지 하그리브스가 엮은 이 책은 동시대 대형 공원의 설계가 큰 규모의 물리적 토지를 설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다양하고 다각적인 주체와 대상과 이슈를 지혜롭게 조정하고 경영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대형’과 ‘공원’이라는 두 개의 교점으로 짜여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시선의 여러 필자가 집필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정교한 개념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독자의 지적 자극을 추동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각의 챕터는 현재의 조경 담론이 생산할 수 있는 공원(과 설계)의 쟁점들을 개별적으로나마 조명하고 있다. 니나-마리 리스터는 지속가능한 공원의 생태적 설계를 안정성보다는 교란과 복잡성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한다.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론을 바탕으로 대형 공원의 불확실성과 그 이면을 경고한다. 린다 폴락은 부지의 역동성과 이질적 국면을 담는 정체성 구축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는 프로세스 중심 설계와 장소성 형성의 양립 가능성을 진단한다. 존 비어즐리는 대형 공원에서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갈등과 모순을 짚어낸다. 책의 결론격인 줄리아 처니악의 챕터에서는 이 책을 관통하는 논점이라 할 수 있는 ‘가독성’과 ‘탄력성’ 개념을 중심으로 동시대 도시에서 대형 공원의 생성적 역할이 논의된다.
이 책을『경관의 회복Recovering Landscape』(1999) 및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Reader』(2006, 국내 번역서는 2007)과 함께 일독한다면, 현대 공원의 설계적 쟁점은 물론 조경 이론과 실천의 동시대적 지형도를 파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엄격한 이론서로만 읽힐 이유는 없다. 예컨대 용산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 설계에서 형태―또는 장소성―와 프로세스 사이의 모순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면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나 줄리아 처니악의 챕터를 펼쳐 볼 만하다. 언어로만 소비되는 생태적 공원 설계의 난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니나-마리 리스터의 논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민관의 협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공원 운영에서 공공성과 사유화의 경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존 비어즐리가 제기하는 문제와 사례에 귀 기울일 만하다. 지난 몇 년간 홍수처럼 쏟아진 우리나라의 대형 공원 설계 공모를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독해 보는 작업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동시대 대형 공원의 이러한 컨텍스트는 센트럴 파크식의 ‘착한 공원’ 이미지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공원 인식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와 큰 면적의 공원을 요청하고 있다. 조경가는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공원의 대량 생산에 복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공원’이고 ‘다른 방식의 공원 설계와 경영’인 것이다. 이 시대의 대형 공원은 복잡한 가치들이 동거하는 복합성의 숙명을 안고 있다. 형태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프로세스의 작동과 생태적 성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둘러싸고 얽힌 다중의 이해 당사자, 그리고 공원과 함수를 맺고 있는 정치 논리와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이러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원 설계는 결국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낭만적인 공원, 즉 착한 공원이라는 반쪽짜리 공원을 낳기 마련이다. …… 이제 대형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좋은’ 대형 공원의 조건을 물을 때이다.
‘대형’과 ‘공원’이라는 두 개의 교점으로 짜여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시선의 여러 필자가 집필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정교한 개념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독자의 지적 자극을 추동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각의 챕터는 현재의 조경 담론이 생산할 수 있는 공원(과 설계)의 쟁점들을 개별적으로나마 조명하고 있다. 니나-마리 리스터는 지속가능한 공원의 생태적 설계를 안정성보다는 교란과 복잡성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한다.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론을 바탕으로 대형 공원의 불확실성과 그 이면을 경고한다. 린다 폴락은 부지의 역동성과 이질적 국면을 담는 정체성 구축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는 프로세스 중심 설계와 장소성 형성의 양립 가능성을 진단한다. 존 비어즐리는 대형 공원에서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갈등과 모순을 짚어낸다. 책의 결론격인 줄리아 처니악의 챕터에서는 이 책을 관통하는 논점이라 할 수 있는 ‘가독성’과 ‘탄력성’ 개념을 중심으로 동시대 도시에서 대형 공원의 생성적 역할이 논의된다.
이 책을『경관의 회복Recovering Landscape』(1999) 및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Reader』(2006, 국내 번역서는 2007)과 함께 일독한다면, 현대 공원의 설계적 쟁점은 물론 조경 이론과 실천의 동시대적 지형도를 파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엄격한 이론서로만 읽힐 이유는 없다. 예컨대 용산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 설계에서 형태―또는 장소성―와 프로세스 사이의 모순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면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나 줄리아 처니악의 챕터를 펼쳐 볼 만하다. 언어로만 소비되는 생태적 공원 설계의 난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니나-마리 리스터의 논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민관의 협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공원 운영에서 공공성과 사유화의 경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존 비어즐리가 제기하는 문제와 사례에 귀 기울일 만하다. 지난 몇 년간 홍수처럼 쏟아진 우리나라의 대형 공원 설계 공모를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독해 보는 작업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동시대 대형 공원의 이러한 컨텍스트는 센트럴 파크식의 ‘착한 공원’ 이미지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공원 인식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와 큰 면적의 공원을 요청하고 있다. 조경가는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공원의 대량 생산에 복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공원’이고 ‘다른 방식의 공원 설계와 경영’인 것이다. 이 시대의 대형 공원은 복잡한 가치들이 동거하는 복합성의 숙명을 안고 있다. 형태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프로세스의 작동과 생태적 성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둘러싸고 얽힌 다중의 이해 당사자, 그리고 공원과 함수를 맺고 있는 정치 논리와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이러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원 설계는 결국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낭만적인 공원, 즉 착한 공원이라는 반쪽짜리 공원을 낳기 마련이다. …… 이제 대형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좋은’ 대형 공원의 조건을 물을 때이다.
- 줄리아 처니악, 조지 하그리브스 엮음 ·
-
다른기사 보기
새로나온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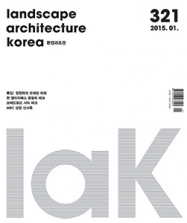
- 월간 환경과조경 2015년 01월(통권 제321호)
편집부/2015.01
환경과조경
에디토리얼: 아름다운 잡지 _ 배정한 오피니언: 12월호를 읽고 칼럼: 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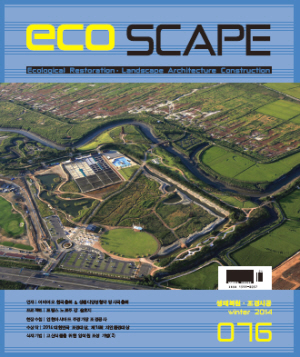
- 조경생태시공 2014년 겨울호 통권 제76호
편집부/2014.12
환경과조경
-
-

- 환경과조경 2014년 12월, 통권 제320호
편집부/2014.12
환경과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