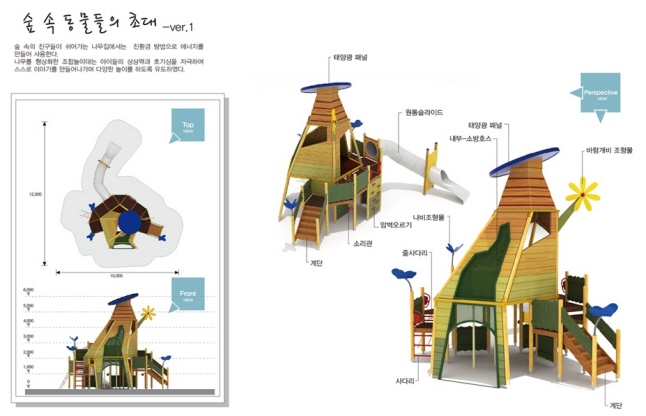조경Ⅰ_ 내러티브 시대의 조경, 표정 가득한 용산공원
[경공환장] “다시 보는 일상, 느껴 보는 도시” Part 2: 03 조경"경공환장: 다시 보는 일상, 느껴 보는 도시" Part 2: 03 조경
[ 03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현대 조경의 내러티브, “이야기 조경”의 미래
안명준 조경비평가
조경Ⅰ: 내러티브 시대의 조경, 표정 가득한 용산공원
한국조경은 담론에 목말라하면서도 담론 생산에 익숙하지 못하다. 용산공원은 한국조경의 동시대 신랄한 현장이자 담론의 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최근의 용산공원 설계안은 현대 한국조경의 맨 모습으로서 그 단면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한국조경의 현장으로서 그 설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경의 상황을 가늠해 보자. 이때의 접근은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렌즈를 사용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조경의 내러티브, 용산공원 설계작들
이야기는 인간 산물의 모든 것에 존재한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며 우리는 스스로 그 이야기의 견고함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였지만 그러한 노력도 결국 새로운 이야기로 남는다. 우리가 흔히 잊지만 디자인은 어떤 것보다 이 이야기의 효과에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산공원 설계작들을 살펴보자.
“Healing: The Future Park”는 치유하는 공원을 이야기한다. 자연, 역사, 문화라는 세 축의 치유를 통해 미래로 향하고자 하는 공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의 세부 주제는 삼천리금수강산의 회복, 부지 역사에의 직면, 도시와의 만남이다. 이것은 다시 지속가능성, 웰빙, 사회적 관계, 교육, 예술과 문화라는 축에서 공간적 전략으로 풀려나간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간 어휘로는 차경, 생태, 소셜 미디어, 밤문화, 국제공원 등이 사용된다.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는 용산과 남산이 하나라고 강조하며 지형의 회복과 새로운 숲이라는 의미로 시작한다. 이 숲으로 도시 구조의 재편, 남산 지계의 연결, 감각의 회복, 완충과 전이지대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원은 숲을 매개로 용산구 전체로 확대되고 나아가 근대문화유산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미래의 공원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공원운동(Social Park Movement), 지속가능 프로그램 인프라, 치유와 공존 등의 공간적 전략이 나타나고, 풍정원(風情園), 능동적 건축, 네트워크된 숲, 자족적 공원 등의 공간 어휘가 사용된다.
“Openings - Seoul’s New Central Park”는 꼼꼼한 대상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열림이라는 관대라고 개방적인 초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설계 방안을 토공사와 지형, 프로그램 플랫폼, 이동 통로 매트릭스, 산림지와 서식지 재건 등으로 직접적이고 디자인적인 공간 전략으로 바로 들려준다. 이후 각 공간별 설계안을 보여주고 대상지의 적용 요소별 설명을 역시 바로 들려준다.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는 공원을 사회문화적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빠른 개방과 느린 완성을 이야기한다. 대상지를 읽어나가며 자연스럽게 설계 전략이 이야기되도록 하면서, 공원의 재조직, 건축의 재사용, 녹색의 재사용, 공간 프로그램 할당 등의 공간적 전략을 설명한다. 재사용 매뉴얼, 사회적 대여 등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Multipli-City”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한다. 서울과 용산공원의 강렬성과 다양성이라는 나름의 분석 지표를 보여주며 통합과 복구, 재생이라는 전략을 이야기한다. 이는 다시 인터커넥팅, 도시와의 교류, 숲과 비움 등의 공간 전략으로 설명된다. 대호수, 호반 산책로, 박물관 거리, 스카이워크, 수목원 마을, 다문화 거리, 에너지 필드 등과 같은 공간 어휘가 사용된다.
“Sacred Presence Countryside in Citycenter”는 한국의 정신을 들판에서 찾으며 도심에 시골을 불러들이자고 말하고 과정과 경험을 설계한다고 이야기한다. 대상지를 꼼꼼히 설명하며 역사, 양호한 어바니즘, 민주주의, 풍경의 복구, 지속가능성 등의 매트릭스를 보여준다. 공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개의 임무와 5개의 양상이라는 독특한 방법 등을 동원하며 이슈를 구조화하고 각각의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한다. 홍수 관리자, 토지 재배, 생태적 척추, 거품 속의 삶, 경험의 삶, 생각을 위한 음식, 게 잡이 광장 등의 공간 어휘가 사용된다.
“Yongsan Madangs”는 작은 단위의 마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마당코드 시스템이라는 독자적 이야기를 강조한다. 제안된 전략으로는 범주화, 육성, 연결이라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 경계부 순환, 생태적 복원, 엣지마당이라는 세부 사항으로 확장하며 기존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베이직 플랜을 짜나간다. 산수회복 전략, 인터액티브 용산, 미래에 대한 응답, 최소 충격, 모바일 컨테이너 등의 공간 어휘가 사용된다.
“Connecting Tapestries from Ridgeline to River”는 대상지를 숨겨진 보물이라고 설명하며 제안을 산세와 물길을 잇는 자연과 역사 문화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태백산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전체 공원의 모습을 마스터 플랜으로 먼저 보여준다. 이후 생태, 도시 등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보존과 복원, 재생적 조경 등을 설명한다. 생태적 척추, 능선 정체성의 개선, 기존 유산의 확대, 에너지생산 프레임워크, 유산 공원, 커뮤니티 공원, 국립 식물연구 가든 등의 공간 어휘가 사용된다.
짧게 살펴본 것이기에 각 이야기들의 핵심만 나열되었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설계안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스펙트럼은 조경설계에 조금이라도 연이 있다면 여기에 서술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만 할 것이다. 또한 조경설계가 하나의 예술적 창의의 과정임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과정과 유사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위한 조경
위기 속의 조경이란 결국 이야기가 없거나 흐린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내러티브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과도 비슷하다. 용산공원은 국내외 조경가들이 머리를 맞댄 지켜볼만한 이야기의 장이었으며, 이것은 그대로 동시대 조경설계의 위상과도 연결된다.
대부분의 설계작은 땅의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흐른다. 그러나 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까,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땅 읽기는 대체로 지형을 수치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사회통계적인 추상적 분석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다보니 각 설계작의 이야기들은 저마다의 스펙트럼을 보이며 펼쳐지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이 다시 땅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각각 의문을 들게 한다. 뭔지 모를 미진함이 가시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원스럽지 못한 셈이다.
그렇더라도 각 설계작들이 보이는 내러티브의 구조는 저마다의 완성도로 치닫는 것이 사실이며, 핵심이 되는 설계개념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레토릭이 그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 조경의 지금이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조경의 미래, 테크네 조경
우리 조경은 전통적으로 이야기가 함께하는 문화였다. 소쇄원이 그렇고 보길도원림이 그렇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야기는 단순히 서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문화이자 인문학이기도 하다. 조경문화의 뿌리는 거기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과 설계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현대 조경은 여기에 강조를 두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결국 용어뿐인 조경의 한 단면으로 한때 비평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살펴본 용산공원 설계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의 생산보다는 개별 개체로서의 ‘조경’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그것은 여전한 설계 관성의 이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설계의 이야기 수준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것은 조경이 하나의 기술이면서 예술이라는 오랜 믿음을 다시 들추게 만든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자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결국 내러티브 구조를 형성하며 일상의 조경 문화로서 확장되게 되는데, 그 현실화 핵심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테크네(techné)의 복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가는 이제부터 이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기 조경의 미래는 테크네 조경인 셈이다. (테크네에 대해서는 Part 1의 조경편 참조)


조경은 결국 자연에 대한 내러티브다.
* 사진 및 그림: 조경비평 봄의 『용산공원: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출품작 비평』(나무도시, 2013)과 용산공원 홈페이지, 소쇄원 홈페이지, 박희성, 안명준
경공환장 Part. 1 다시보기 '조경 편'
- 연재필자 _ 안명준 조경비평가 · 서울대
-
다른기사 보기
inplusgan@gmail.com
기획특집·연재기사
- · “생각”으로 즐기는 경공(景空), “생각”으로 그리는 환장(環場) - 2
- · “생각”으로 즐기는 경공(景空), “생각”으로 그리는 환장(環場) - 1
- · 모여 즐기는 “통합”, 창발적 협동인 “통합” - 2
- · 모여 즐기는 “통합”, 창발적 협동인 “통합” - 1
- · “전통” 없는 사회와 그 적들 - 2
- · “전통” 없는 사회와 그 적들 - 1
- · 과생산의 사회와 “환경” 스트레스 - 2
- · 과생산의 사회와 “환경” 스트레스 - 1
- · 체현의 “공간”과 감성적 삶터 - 2
- · 체현의 “공간”과 감성적 삶터 - 1
- · 이름만 큰 ‘도시’와 이야기 없는 ″장소″ - 2
- · 이름만 큰 ‘도시’와 이야기 없는 ″장소″ - 1
- · 도시신생과 도시풍경을 위한 ″놀이도시(Ludic City)″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