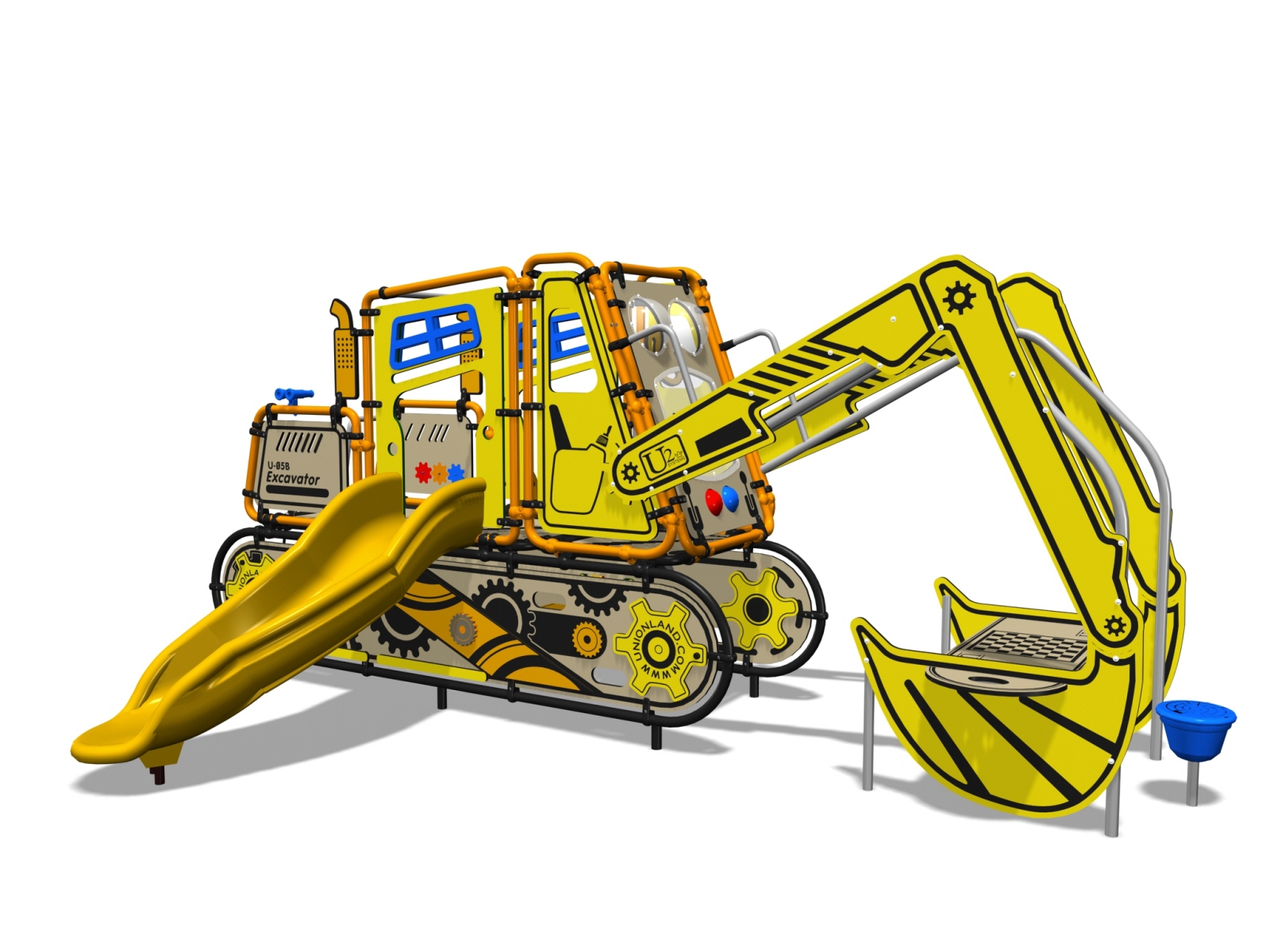10장소_ 뿌리뽑힌 이야기, 우리만 모르는 ‘장소’(下)
경공환장: 다시 보는 일상, 느껴 보는 도시_10회융합적 ‘공간’, 통합적 ‘장소’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말한다. “장소(성)의 본질은 외부와는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에 있다.”고. 그것은 동시에 “물리적 사물, 행위, 의미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체계”이며, “장소의 내부에 있다는 말은 그 장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장소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는 이것이 장소가 공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한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도 말한다. “장소는 일상생활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공간적 친밀감, 소속감 및 이를 통해 부여된 어떤 감정(즉 장소감) 등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적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이들의 지적을 이정표 삼아 이야기를 지워온 모더니즘을 반성한다면, 이야기를 되살리고 끄집어내는 것부터 장소 되찾기, 만들기는 시작될 것이다. 장소에 영(靈)이 있다는 사고는 노동의 본래 의미를 생각케 하며, 자연에 영혼을 두고 이해하였던 농촌 사회의 인간 정신, 내면 세계를 재소환하는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장소성이란 농촌사회, 공동사회의 아비투스이며, 지역 사회의 지식 공유 방식이다. 작금의 장소 만들기는 그것을 삶터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장소를 보이는 장소성으로 사람들 사이에 현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일상적 기계 복제와 인터넷의 시대에 장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스럽다. 다만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지금여기의 실천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 과오를 되풀이하지는 않아야 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석과 종합이라는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했던 모더니즘적 실천의 잔영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 장소 만들기가 빠져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장소와 이야기 사이를 재접속할 필요는 여기에서도 다시 중요해진다.
그러한 반성 중의 한 가지는, 이야기는 통합적이라는 점이고, 이와 재접속하는 장소, 이야기의 원리를 따르는 장소 또한 통합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이란 융합과는 다른 혼합의 방법이다. 이야기는 각각의 소재들을 하나로 엮어 또 다른 완전함을 이루는데 특징이 있다. 각각의 소재들을 녹여 화학적으로 섞어 만든 새로움과는 다른 것이다. 각자가 살아있으며 새로운 완전함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야기와 장소는 통합적이며, 그것은 민주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장소에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다면, 이것과 연관된 것이리라. 장소는 기계가 아니지만,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각자의 이야기가 이루어내는 통합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에 대해서는 공간적 개념과 관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모두를 녹여 섞으려는 무자비함을 품게 한다. 장소의 논리는 통합(통합성, 통합의 논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국 북경의 천단공원에서 태극권을 연마하는 사람들
조경, 우리 도시의 장소 식재(植栽)
무엇보다도 장소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말자. 퍼포먼스 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렷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공간이든, 환경이든, 경관이든 어디에서나 특별함을 가지고 놓여질 수 있다. “특별히 잘 다듬고 가꾸는 마당”을 장(場)으로 불러온 역사가 있으나 그보다는 장소가 그러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 도시가 개발로 인해 장소성을 잃어온 것은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장소를 되살리자는 호들갑이 요란한 셈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을 좇아가다보면 아직도 개발 논리의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장소를 브랜드로 또 다른 개발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할 때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분야가 장소를 도시의 중요한 실천 방향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더구나 여기에 조경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소란 사람이 지구와 맺는 이야기의 일부이므로, 결국 장소 되찾기의 핵심은 우리 도시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되살리느냐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란 사적 영역에서라기보다는 우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공적 영역에서 먼저일 수밖에 없다. 최근 도시건축 분야의 관심이 공공영역으로 쏠려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알다시피 조경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다루는 전문분야이다. 그 대중적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도시에서 조경의 사회적 영역이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적 영역에 대한 수많은 실천과 노하우가 조경에 먼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우리 도시의 장소(성)는 그러므로 일상을 다루는 조경과 새로운 동거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마디로 근대 이후의 조경은 우리 도시에 장소를 식재하며 자연을 매개로한 도시의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경의 관심이 다방면으로 확장되기도 하였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장소 식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거주지 주변의 공원과 정원은 그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고민해야 한다. 개발과 변화의 타겟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가 아니라 도시의 일상과 역사를 간직하는 이야기의 저장고로서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또 그간 일상적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조경의 손길과 장소 식재를 고려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가득 담아야 한다. 잊혀지고 지워진 장소(성)들은 그렇게 피어나 우리 도시를 활기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연재필자 _ 안명준 조경비평가 · 서울대
-
다른기사 보기
inplusgan@gmail.com
- 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기획특집·연재기사
- · “생각”으로 즐기는 경공(景空), “생각”으로 그리는 환장(環場) - 2
- · “생각”으로 즐기는 경공(景空), “생각”으로 그리는 환장(環場) - 1
- · 모여 즐기는 “통합”, 창발적 협동인 “통합” - 2
- · 모여 즐기는 “통합”, 창발적 협동인 “통합” - 1
- · “전통” 없는 사회와 그 적들 - 2
- · “전통” 없는 사회와 그 적들 - 1
- · 과생산의 사회와 “환경” 스트레스 - 2
- · 과생산의 사회와 “환경” 스트레스 - 1
- · 체현의 “공간”과 감성적 삶터 - 2
- · 체현의 “공간”과 감성적 삶터 - 1
- · 이름만 큰 ‘도시’와 이야기 없는 ″장소″ - 2
- · 이름만 큰 ‘도시’와 이야기 없는 ″장소″ - 1
- · 도시신생과 도시풍경을 위한 ″놀이도시(Ludic City)″ - 2